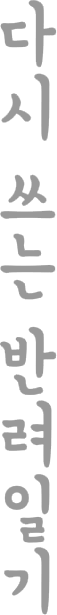
반려동물의 화해
대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은 항상 용서하고 반려동물이 용서를 받게 될 거라 생각한다. 이 가정이 너무나 당연한 이유는 반려인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말썽을 부릴 목적이나 계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카는 거실 러그에 배변을 해서 내게 혼났지만, 내가 모카의 방석 위에 배변을 할 리는 없다(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모카는 밥투정을 해서 내 속을 썩이지만, 내가 식음을 전폐해도 모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생각만 해도 너무 서운하다). 모카가 내 옷의 장식을 물어뜯어 망가뜨린 일은 있지만, 내가 모카의 옷을 물어뜯어 망가뜨릴 필요는 없다(생각만 해도 너무 싫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반려동물을 용서하는 존재, 모카는 용서받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또 이 관계는 몹시 일방적이라 모카는 말썽을 부리고도 사과하지 않는다. 이 역시 몹시 당연하다. 모카는 “미안해요.”라고 사람 말을 할 수 없다. 눈치껏 주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지면 곁에 다가와 머리를 기대고 애교를 떨면 그만이다. 내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카는 자세히 알 수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을 터다.
하지만 이 당연한 진리가 뒤집힌 날이 있었다. 거실에서 모카와 둘이 장난감을 갖고 놀던 때였다. 모카가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는데 어찌나 몸이 날렵한지 몸놀림이 나보다 훨씬 빨랐다. 잽싸게 장난감을 입에 물고 나를 약 올리며 펄쩍거리는 모카가 조금씩 얄 미워졌다. 그렇게 장난감을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며 놀던 중 나는 모카의 몸통을 붙잡았고 재빠른 모카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며 뒷다리가 걸려들었다.
“깨갱!”
모카의 입에서 높은 톤의 비명이 터져 나올 때 이상하리만치 내 주변의 시간은 모두 멈췄다. 마치 칠판을 긁고 지나가듯 날카로운 아픔이 담긴 비명이었다. 깜짝 놀라 바라보니 모카가 멈춰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엎치락뒤치락 놀던 차에 내 손이 모카의 뒷다리를 아프게 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1분쯤 모카는 다리를 살짝 절었다.
이래서 개를 키우는 게 무서웠는데.
여름이를 떠나보낸 게 오롯이 나 때문이라고 여겼던 15년 전 가을처럼 나는 얼어붙었다. 나로 인해 동물이 다치고 심각하게 아프다면 나는 동물을 키우면 안 되는 존재 아닐까? 몇 초 사이 이런 자괴감이 몸속에 쑥 들어왔고 눈물이 철철 흘렀다. 방 안에 있던 남편이 놀라서 달려 나왔다. 남편을 붙잡고 말했다.
“역시 나는 개를 키우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남편은 모카의 다리를 확인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비명을 지르고 1분쯤 지난 후 모카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펄쩍펄쩍 뛰었지만 나는 가까이 다가가는 게 두려웠다. 남편은 우는 나를 달랬다.
“여보, 괜찮아. 놀다가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조심하면 돼. 모카는 이제 괜찮아.”
“아니야, 나 이제 모카랑 안 놀아. 모카 안 만질래. 나 때문에 또 다치거나 아프면 어떡해? 그럼 나 평생 죄책감 생길 거야.”
모카를 키우며 괜찮아진 줄 알았던 오래된 트라우마는 나를 덥석 깨물고 과거로 떠날 채비 중이었다. 트라우마는 거대한 뱀처럼 순식간에 다가와 온 정신을 휘감았다. 나는 소파 위로 올라가 모카를 외면했다.
“안 만질 거야. 내가 만졌다가 다칠까 봐 무서워. 여보가 모카 데리고 좀 떨어져 있어.” “괜찮아, 여보. 모카 좀 봐봐. 모카가 여보한테 왔잖아.”
소파 위에 웅크린 채 옆을 내려다보니 다리가 아팠던 건 까맣게 잊은 듯 발랄한 표정의 모카가 내 무릎에 앞발을 얹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엔 원망도, 놀람도, 아픔도 없었다. 해맑은 표정으로 울고 있는 내 얼굴 구석구석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위로하는 듯했다.
‘울지 말아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모카는 깨갱 하고 비명을 지른 당사자이면서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얼굴이었다. 위로하듯 다가와 앞발로 톡톡 건드리며 웅크린 자세를 풀고 이리 오라고 손짓했다. 나 때문에 잠시나마 아팠으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안기는 모카에게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다. 모카는 계속 소파에서 내려오라는 듯 앞발로 나를 건드렸다. 망설이다 바닥으로 내려갔더니 좀 전까지 갖고 놀던 장난감을 물고 내 품에 쏙 안겼다. 뭉실뭉실한 털 뭉치 같은 모카는 혀를 쏙 내밀고 헤헤 웃는 얼굴로 ‘자, 이제 우리 다시 놀아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생각해 보면 키우는 입장이라 늘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나는 키우는 동물에게 사과하는 방법을 몰랐다.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놀던 중에 모카를 아프게 했을 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감도 못 잡았다.
그런데 태어난 지 일 년도 안 된 모카는 상대를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어색함을 풀고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자연스레 터득한 것처럼 굴었다. 40년 가까이 살며 사과법도 익히지 못한 나와 달리 모카는 일 년여의 삶 동안 어떻게 용서 비법을 터득한 걸까?
하물며 동물에게만 그럴까. 사람으로 살면서 타인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은 여전히 어색하고 낯설다. 어떤 갈등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앞뒤 맥락과 자신의 기분, 감정에 따라 대응 방법을 선택한다. 혹은 지금 화해하고 용서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계산도 하게 마련이다. 때문에 인간사의 화해는 종종 냉정하게 완성된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화해는 달랐다. 사람이 터득하지 못한 평화의 기초를 동물인 모카는 본능처럼 꿰고 있었다. 다리가 잠깐 아팠지만 자신에게 해를 입힌 상대를 즉시 용서했고 용서에 ‘뒤 끝’이나 ‘계산’ 따윈 없었다.
모카는 용서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에 충실하게 있는 그대로 상대를 용서하고 다시 함께 어울릴 수 있었다. 그러니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보다 월등하고 늘 용서만 하는 존재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 분명 유대 감각에 있어 모카는 나보다 월등했다.
그래서 태평하게 거실 러그에 배변을 하고 내 옷의 장식을 물어 망가뜨리고 한 번씩 밥투정했는지도 모르겠다. 용서도 화해도 본능처럼 자연스러우니 얼마든 괜찮다면서 말이다. 아마 그렇게 말썽을 부릴 때 모카의 속마음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
‘괜찮아! 내가 이렇게 저질러놔도 사과하고 화해하면 되니까!’ 모카와 살면서 이제야 나는 본연의 화해법을 곁에서 보고 배우는 것만 같다.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용서와 화해, 그 단순하고 순연한 유대 감각을 38년짜리 인생이 1년짜리 견생에게 배우는 신비한 오늘이다.
'시·에세이 > <다시 쓰는 반려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8. 파양에 꽃길은 없다. (0) | 2022.02.14 |
|---|---|
| 07. 만약 내가 키우지 않았더라면 강아지가 안 죽었을까? (1) | 2022.02.11 |
| 05. 강아지의 목줄이란(feat. 우리 개는 안 물어요) (2) | 2022.02.09 |
| 04. 개헤엄을 못 치는 강아지 (1) | 2022.02.08 |
| 03. 강아지 독박육아 (1) | 2022.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