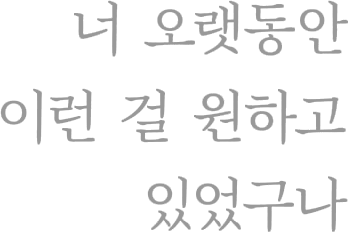
지나고 나면 부끄러운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부끄러운 사건들이 여러 상황에서 생겨났다. 우선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글쓰기는 턱없는 글쓰기 실력 탓에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일쑤였다. 게다가 임신과 출산이 이어지면서 점점 더 글을 쓰기 힘들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 거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입덧과 자도 자도 밀려오는 졸음, 나중에는 잠을 제대로 자기 힘든 괴로움을. 아기의 탄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지만 퇴원 후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전쟁 같은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힘들어서 직장은 그만두었지만 글쓰기는 이어가고 싶었다. 성실하게 글을 쓰겠다는 다짐도 여전히 유효했다. 아쉬운 것은 마음속 다짐과 달리 결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거였다. 그것은 어느 날 온 가족에게 공개된 부끄러운 내 수입으로 드러났다.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였다. 나의 신혼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시댁이 있었다. 그날은 시누이 부부도 온다고 하여 시댁으로 갔다. 시댁 식구들은 밥을 먹고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생활 속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모두가 알 만한 공통 주제를 찾거나, 말해도 모두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졌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결혼하고 몇 해 되지 않은 때라 나는 대화에 끼기가 어려웠다. 다들 서로 편하고 친한데 나는 아직 그들과 친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으니 그리될 수밖에 없었다. 대화 내용 속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뻔히 보여 상대의 말을 받아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생겨 이어서 묻고 싶은 것도 있었고, 비슷한 내 경험도 들려줄 것이 떠올랐지만 말할 기회를 쉽게 얻지 못했다. 그래서 시댁에서 돌아오고 나면 남편을 붙잡고 더 떠들어댔는지 모르겠다. 가족이 되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내게 ‘너는 어떠니?’ 하고 궁금해하지 않는 느낌이었다. 아무튼, 그날 저녁 모임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날 갑자기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나에 대해 한마디를 했다. 어떤 이야기 끝에 나온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만 또렷이 기억난다.
“경선이 연봉이 200이야. 히히!”
남편은 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수다가 생겼지만, 신혼 때의 남편은 남의 말을 주로 들으며 웃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시댁에서 나의 연봉을 깐 거다. 남편의 말에 다들 웃었지만 별다른 반응을 얹지는 않았다. 어쩌면 달리 반응하기 난처했을지도 모른다. 나도 그때는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멋쩍게 웃어 보이기만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생각할수록 너무 창피했다. 우리 모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가. 나의 연봉이 나의 가치처럼 보일 텐데, 인심 써서 당시 물가를 계산에 넣어본다고 해도, 연봉 200만 원은 적어도 너무 적은 금액이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남편을 원망했다. 남편은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의 연봉이 200만 원이란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내용이었다면 남편은 거기서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 말수도 많지 않은 사람이 한 한마디였다. 그건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 (하하하!)’라는 뜻을 가지고 한 말이 분명했다.
나는 다시 친구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작가도 월급쟁이처럼 꾸준히 일해서 돈을 번다고 했는데, 이건 쥐꼬리는커녕 쥐 발톱만도 못한 거였다. 작가가 월급쟁이처럼 일해서 일반 월급쟁이만큼의 돈을 번다는 건 꽤 성공한 경우에나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수준의 내가 계속 글을 써야 할까? 관두는 게 나은 걸까?’
내가 내게 묻고 있었다.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글 써서 얻는 벌이도 시원찮고, 게다가 연봉이 만 천하에 알려져 망신까지 당하고 나니 속상하고 기가 죽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다.
‘아기를 돌보느라 책 읽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그런데 글을 쓰려면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하지? 그래, 바로 그거야! 나는 나를 위한 책 읽기를 하며 돈까지 버는 거네. 누가 책을 읽는다고 돈을 주겠어!’
나는 가난한 나의 글쓰기를 이렇게 합리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죽어 있던 나 자신에게 다시 말했다.
‘포기할 줄 알았지? 천만에!’
'시·에세이 > <너 오랫동안 이런 걸 원하고 있었구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5. 글을 팝니다. (마지막 회) (1) | 2022.03.24 |
|---|---|
| 04. 넘어질 기회 (2) | 2022.03.23 |
| 03. 무서운 사람 (1) | 2022.03.22 |
| 02. 쏟아진 한 끼, 쏟아진 눈물 (1) | 2022.03.21 |
| 00. <너 오랫동안 이런 걸 원하고 있었구나> 연재 예고 (3) | 2022.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