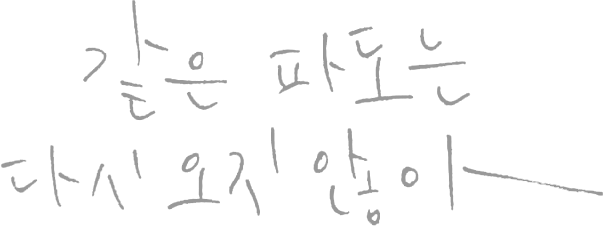
꼬르륵.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물속에 몸을 던지며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밖에서 사람들이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을 보았을 때 들었던 소리는 ‘풍덩’이었는데, 정작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듣는 소리는 자신의 숨소리뿐이다. 발을 떼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들어갔는데 이퀄라이징이 안 되면 어쩌지? 내가 패닉에 빠지지는 않을까? 물속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그러나 막상 물 안에 몸을 던지자 저 육지 세상보다 더 큰 평온이 찾아왔다. 엄마의 배 속에 있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고요했다. 엄마의 배 속에 있을 때 아이들이 바깥 소리를 이렇게 듣는다는 이야 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주 작게 웅얼거리는 소리처럼 말이다. 물속에 들어가자 새 소리도, 파도 소리도, 사람들의 환호 소리도 아득했다. 그래. 내겐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

스쿠버 다이빙은 언제나 내 로망이었다. 스쿠버 다이빙은 내게 자연 속으로 완전히 뛰어드는 스포츠처럼 보였다. 가끔 휴양지에 가면 물안경을 쓰고 스노클링만 하면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했다. 스노클링을 하는 사람에게 허용된 건 물의 얕은 부분뿐이었지만, 스쿠버 다이버들은 깊은 곳까지 오래 헤엄을 치다 왔다. 그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보지 못한 세계였는데도 어쩐지 그리웠다. 나는 매일 일을 하느라 바빴고, 남는 시간에도 아이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말로만 듣던 바다 속 고요를 꿈꿀 여유도 없는 날들이 쉼 없이 지나갔다. 그러다 2010년, 첫째 아이가 졸업하면서 내게도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자마자 나는 친구들과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여행을 계획했다. 드디어 가는구나! 그 여행을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해 정신없이 일했다.
삶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태도뿐이라고 누가 그랬더라. 스쿠버 다이빙 여행을 앞두고 사고가 났다. 손뼈가 부러지고 깁스를 해야 했다. 꽤 큰 사고였기에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많았다.
“그래서 여행 갈 수 있겠어?”
“가야지. 돈도 미리 다 냈는걸.”
“그럼 스쿠버 다이빙만이라도 안 할 수는 없어?”
아들 둘은 내 팔을 걱정했다. 나라도 깁스를 하고 여행을, 그것도 스쿠버 다이빙을 하겠다는 사람을 봤다면 말렸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을 때였다.
인간은 기대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지 않나.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순간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서라기보다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행복한 지금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안 될 거라는 의사를 설득해 깁스를 반깁스로 바꾸고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다. 다이빙 옷은 한 손으로도 입을 수 있다고, 수영도 한 손으로 하면 된다고 나와 타인을 속이면서 말이다.
드디어 도착한 스쿠버 다이빙 교육장은 필리핀의 보홀이라는 섬에 있었다. 보홀에는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닐라에서 경비행기로 갈아타고 보홀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다보았던 그 풍경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교육장에서는 강사가 나눠 준 옷을 입었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컸다.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입는 전신 슈트는 몸에 꼭 맞아야 좋다. 슈트가 몸의 체온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몸과 슈트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바꿔 달라고 할까?’ 헐렁한 슈트를 입고 강사가 있는 곳으로 나왔다. 바꿔 달라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강사들은 다 바빠 보였다. 게다가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인지라 오히려 말하기 쉽지 않았다. 나는 업무 외에 사적인 자리에서 지인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걸 어려워하는 편이다.
그때는 다이빙에 대해 잘 모를 때라, 괜찮을 거라 스스로를 타일렀다.
‘괜히 바쁜 사람 괴롭히지 말자. 뭐, 큰 차이 있겠어?’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나는 덜그럭거리는 슈트를 입고 교육에 참여했다.
'시·에세이 >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0. 언니는 언니 없이 어떻게 버텼을까? (마지막 회) (2) | 2022.09.08 |
|---|---|
| 09. 다시 물 위로 떠오르기 위해, 천천히 뛰어들고 천천히 떠오르기 (1) | 2022.09.07 |
| 07. 그런 게 바보라면 나는 기꺼이 바보가 되겠어. (2) | 2022.09.05 |
| 06. 우리가 널 기억하는 동안에는, 넌 살아 있는 거야 (0) | 2022.09.04 |
| 05. 우리는 언제 죽을까? (1) | 2022.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