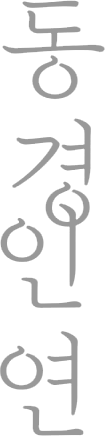
동화작가의 영혼을 가진 우체국 아줌마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에는 여러 버전이 준비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줌마와 나는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편집하는 능력을 즐기기 때문이다.
마치 하루종일 노래하는 새처럼 우리는 서로의 머리 위로 말풍선이 떠다닌다는 걸 첫눈에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체국 아줌마는 시간여행자로서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만나러 온 것 같았다.
우리는 마주 본다. 그리고 정해진 대사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말한다. 마치 운명처럼.

“80엔입니다.”
우체국 아줌마가 창구에서 국제우편에 도장을 찍으면서 말한다. 내가 동전을 세어서 건네주자 우체국 아줌마가 누구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는가 묻는다.
“가족과 친구들이요.”
어느 날인가 한국으로 보낼 편지를 들고 오치아이 우체국 창구에 줄을 서 있자 우체국 아줌마가 한국말로 인사를 한다.
어쩌면 그날, 아니 그 주 첫 대화다운 대화가 아니었을까 싶다. 오치아이라는 마을은 적어도 삼사십 년 전부터 살아 온 원주민이 대부분이었다. 30년 된 동네 책방, 애완 토끼 삼대의 사진을 걸어 둔 사진관, 하루종일 클래식 라디오 채널을 크게 틀어 놓고 다림질을 하는 세탁소, 공중전화 박스와 함께 낡아가는 오래된 집들과 문방구가 있는 골목에 이웃한 작은 우체국에서 오치아이 방을 세준 집주인 부부 이외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나에게 유일하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바로 우체국 아줌마였다. 그것도 한국어로.
이것이 우체국 아줌마에 대한 나의 첫 기억이다.
“이상와 몬꾸오 유우 타메니 기마시다.(이상은 불만을 말하려고 왔어요.)”
우체국 아줌마의 기억은 이렇다. 우체국 창구 앞에서 반송된 편지를 들고 떠듬거리는 일본어로 내가 불만을 말한다.
“그동안 보냈던 편지는 잘 갔는데 왜 이 편지만 돌아왔지요? 이렇게 서울, 코리아라고 적었고, 우표도 국제우편 요금을 붙였는데요.”
세로쓰기가 일반적인 곳에서 가로로 쓴 주소는 받는 사람과 보낸 사람이 뒤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창구 담당자에게 편지봉투의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던 나를 곁에서 지켜보던 우체국 아줌마가 한국말로 인사를 해왔다.
“안녕하세요? 나는 마리라고 해요.”
우체국 아줌마는 닉네임을 썼는데 마리 퀴리 부인을 존경하기에 자신의 이름을 마리라고 지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금방 불탄 고구마처럼 씩씩거리고 우체국 문을 밀고 들어선 내가 ‘안녕하세요’라는 말에 얼굴이 환해지자 아줌마는 팝콘처럼 일본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라보 회원인데 세계의 언어를 배우며 여행을 하는 단체 회원이다. 지난번에 서울에 갔었는데 음식이 맛있었다. 서울에서 묵었던 집주인에게 감사편지를 쓰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는가 등등.
“저 방에는 누가 사는 걸까?”
둘째 딸의 결혼식 후 큰딸의 손자를 품에 안은 우체국 아줌마가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아니 우리의 만남은 언제가 시작이었을까에 대해 이십여 년이 지나서 둘째 딸 결혼식에 참석한 나에게 아줌마가 처음으로 들려준 이야기였다. 이상과의 만남은 더 오래전에 시작했다고. 우리 둘은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오치아이로 이사한 첫날, 나는 3단 여행가방에 챙겨 온 코펠로 밥을 짓기 전에 양쪽 벽으로 난 커다란 창문에 한국에서부터 가지고 온 한지를 마름모꼴로 붙였다. 한지로 창문을 장식한 것이 이사 온 오치아이 방에서 내가 제일 처음 한 일이었다. 계절에 따라서는 오후 다섯 시만 되더라도 사방에서 덧문 닫는 소리가 나서 세상과 내가 차갑게 분리되는 느낌, 갑자기 방안이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까지 얼어붙을 것 같았던 체험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귀국하기 전까지 6년 동안 방 덧문을 닫지 않고 살았던 그 방.
우체국에서 퇴근 후 어린이집에 있을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던 여성이 내 눈에는 보인다. 오치아이 주택가가 모두 자신들만의 부엌에 불을 켜고 모여앉아 있을 시각, 덧문을 닫은 집들이 만화 속 먹물을 뒤집어쓴 채 골목길로 성큼성큼 비껴 앉아있을 무렵, 오치아이의 2층 방에서만 빛이 흘러나오고 있다. 은은한 한지의 불빛을 눈으로 쫓으며 하루종일 서 있어서 뻣뻣해졌을 다리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인다.
나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나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의지의 상징이 바로 덧문이었다면, 덧문을 닫지 않은 오치아이의 방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우체국 아줌마에게는 어쩌면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또한 누구의 딸도 아닌 온전한 자신만의 방’으로서의 상징이 아니었을까?
오치아이의 불 켜진 방이 이상과 마리 아줌마의 인연의 시작 이라고 말할 때 나에게는 아줌마의 미래의 불 켜진 방이 보이는 듯했다.
'시·에세이 > <동경인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5. 사진가의 사죄 (1) | 2022.03.12 |
|---|---|
| 03. 마지막 기억 (2) | 2022.03.11 |
| 02. 오치아이의 방 (2) | 2022.03.10 |
| 01. 헌책방 시바타 아저씨 (2) | 2022.03.08 |
| 00. <동경인연> 연재 예고 (4) | 2022.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