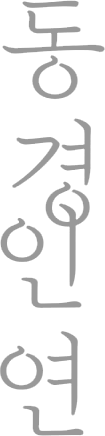
헌책방 아저씨는 낡은 다다미방에서 개 한 마리와 생활했다.
아저씨는 늘 술에 취해 있었다. 작은 헌책방 안은 정리가 안 된 책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가끔 가격을 물으며 아저씨를 바라볼 때면 장사에는 통 관심이 없다는 얼굴로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지금 생각하면 책 뒤에 연필로 가격이 적혀 있었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아니면 적혀 있지 않은 책도 있었던 걸까.
니혼대학 예술학부 청강생 시험을 통과하고 6개월 만에 어학원을 졸업한 나는 대학에서 청강하고 있는 다섯 과목을 듣는 것 이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었다. 하루종일 말 한마디 안 할 정도로 고독한 시간. 이어령 선생님의 『축소지향의 일본인』 일본어판을 서점에서 산 것도 그때 즈음이었다(이 책은 시미즈 선생님이 빌려 가서 내가 귀국한 후에야 돌려주었다). 야채가게에서 장을 보며 한두 마디, 아이스크림 도매상을 하는 집주인 아저씨, 아줌마와의 아침 인사, 한국으로 국제우편을 보내며 우체국 아줌마와 나누는 대화가 다였다.
가끔 역에서 집으로 갈 때 헌책방 안을 들여다보면 헌책방 아저씨가 기르는 개조차 술을 마신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개와 아저씨는 적당히 취한 모습으로 졸고 있었다.
나는 어느 날 장을 보다가 헌책방 아저씨에게 드릴 캔맥주와 치즈가 든 쥐포 스틱을 샀다. 그리고 일본어로 떠듬떠듬 몇 마디를 전했다. 아저씨는 무뚝뚝했지만 그날 이후 인사를 하면 몇 걸음 가게 밖으로 나와 몇 마디 말을 나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저씨는 말수도 적었지만, 수줍음을 많이 타서 낯선 사람과는 좀처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내가 수업 중에 필요한 책이나 읽고 싶은 작가를 대면 찾아주었고 백 엔, 백오십 엔 하는 문고판을 먼지와 함께 건넸다.
그해 여름방학에도 서울행 대신 4조반 다다미방에서 책읽기와 과제물인 단편소설을 쓰며 보냈는데 최고로 더운 날들이 계속되었다. 간이 세면대에서 연거푸 짧은 머리를 감고 덜 말린 머리로 다다미방에 누워 책을 읽다가 귀에 습진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 어느 날 나는 나카노 도서관으로 피서를 가기로 결심하고 교통비가 드는 외출을 결행했다. 금방 미쳐버릴 것 같은 더위라고 할까. 습도는 왜 그리 높은지.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나카노 헌책 도매’에 가던 헌책방 아저씨를 우연히 만났다.
“어디 가니?”
“나카노 도서관 가요.”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다가 도매상에 도스토옙스키 전집이 있으면 사고 싶다고 했더니 아저씨는 나카노 역 옆에 도매상이 있으니 그럼 들렸다 가라고 했다.
그날 우린 친구가 되었다.
헌책방 아저씨와 친구가 된 그날 이후, 6년 동안 단 한 번 내가 살던 4조반의 방에 예기치 않게 아저씨가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나는 욕심껏 신청한 전공과목 과제물 마감을 앞두고 있었기에 창문을 열고 책상에 앉아서 부지런히 400자 원고지를 메우고 있었다. 과목당 400자 원고지 5장이 기본이었기에 5과목이면 1만 자를 채워야 했고, 문장이 꼬이면 다시 써야 해서 손목이 무끈해졌다.
똑똑.
코카콜라 전광판이 점멸하는 창밖 풍경으로 시선을 주다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에 귀를 의심했다. 저녁시간에 누군가 내 방문을 노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가 있다 해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아는 이는 별로 없었고, 알아도 그 시간엔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나처럼 과제물 준비로 바쁠 터였다.
“누구세요?”
“이상…. 시바타입니다.”
방문을 열자 헌책방 아저씨와 그가 기르던 개가 복도에 서 있는 것이었다. 흰색 면티에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던 나는 문을 연 채 잠시 망설였을 것이다. 아쉽게도 그날 저녁 기억은 그게 전부다. 헌책방 아저씨의 수줍은 미소와 어두운 복도에 비에 젖은 개 한 마리가 꼬리를 살살 흔들었던 기억. 그날의 기억을 복기해 본다.
노크 소리가 난다. 방문을 열자 아저씨의 젖은 신발과 접은 우산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우산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복도에 물웅덩이를 만들고 있고 헌책방 아저씨가 거기 서 있다. 우산을 든 아저씨는 산책을 하던 길에 들렀다고 한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아니 헌책방 아저씨의 나이에 가까워지고 보니까 그의 방문은 참 용기가 필요했겠다 싶다. 그리고 말동무가 간절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분도 든다.
그러니까 오치아이라는 주택가는 해가 질 때쯤이면 집집이 덧문 닫는 소리가 요란할 정도로 일찍 밤이 찾아온다. 나와 타인을 가르는 소리요, 세계와 세계를 단절하는 소리로 고독한 사람의 심장을 찢을 듯이 날카롭다.
까닭 없이 쓸쓸한 기분이 들게 하는 주택가 마을에서 빗속의 저녁을 개 한 마리와 걷고 있다. 마침 이런 기분을 알아줄 것 같은 친구가 사는 2층 창문에 덧문이 닫혀있지 않고 열린 채 불을 밝히고 있다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것이다.
창문이 말을 걸겠지. 들어와, 들어와 하고. 평상시라면 그냥 지나쳤을 길을 용기를 내어 대문을 밀고 가파른 철제 계단을 올라 방문을 두드리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그 순간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린 친구니까 빗물을 닦도록 수건을 내줄 수도 있었는데…. 아저씨의 개에게는 한국에서 가지고 온 쥐포를 잘게 찢어서 손님 대접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뜻한 차를 내드렸으면 더 좋았겠지. 아니, 벽장에서 긴 팔 남방셔츠를 꺼내 입고 헌책방 아저씨가 평소에 즐겼던 산책코스를 함께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풍이 올 무렵이면 긴모쿠세이 향이 마을에 가득해서 비현실적인 거리를 걷고 있는 느낌이 나던 오치아이의 골목길을 개 한 마리를 사이에 두고 우산을 받쳐 들고 걸었다면 헌책방 아저씨의 내면 이야기를 더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아저씨는 나의 모습 어딘가에서 여유 없음을 보았을 것이다.
대단히 섬세한 이였으니까. 내 표정 어디에선가 불시에 나타난 그의 존재를 밀어내는 불편함이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걸 놓칠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저씨는 말했다.
“산책길에 불이 켜 있어서 와 봤어.”
불의의 방문에 조금 놀란 20대의 나는 방문을 사이에 두고 어두운 복도에 서 있었던 그의 우산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던 물방울을 보며 대답했다.
“내일 과제물을 내야 하는데 아직 2장밖에 못 썼어요.”
사려 깊은 아저씨가 다시 가파른 철계단을 개와 함께 내려가서 대문을 나설 때까지 어두운 복도의 전등을 켜두었던가 나는….

사람의 기억이란 우습게도 제멋대로 편집하고 각색을 할 때가 있어서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건 헌책방 아저씨는 6년 동안 단 한번 친구의 방문을 노크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비 내리는 저녁에.
나는 그 기억이 떠오를 때면 어쩐지 쓸쓸한 기분이 들어서 창문을 한번 열었다 닫는다. 문밖에 혹시라도 누가 오지 않았을까 하고.
'시·에세이 > <동경인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5. 사진가의 사죄 (1) | 2022.03.12 |
|---|---|
| 04. 우체국의 마리 아줌마 (1) | 2022.03.12 |
| 03. 마지막 기억 (2) | 2022.03.11 |
| 02. 오치아이의 방 (2) | 2022.03.10 |
| 00. <동경인연> 연재 예고 (4) | 2022.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