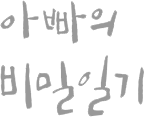

할머니와 나
어렸을 때 나는 할머니와 같이 방을 썼다. 젊어서 혼자가 된 할머니는 서울의 큰아들 집과 순천의 작은아들 집을 육 개월에서 일 년씩, 여행하듯 번갈아 다니시며 노후를 보냈다. 희고 고운 얼굴을 가진 할머니와 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둘이 많이 닮았다고 했다. 그땐 그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갔다. 거울 속 어딘가에는 돌아가신 그의 얼굴이 어렴풋이 함께 있다. 할머니는 기다란 곰방대에 봉초 담배를 다져 넣어 피웠는데, 담배 찌꺼기와 냄새에 불평하는 어린 손자와 티격태격도 꽤 했다. 손자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면 가끔 곰방대를 들어 “이 망할 놈!” 하셨지만 진짜로 때린 적은 없다. 할머니는 한쪽 다리가 불편했다. 지팡이는 외출의 필수품이었고, 막둥이인 내가 그것을 챙기는 당번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나가 놀다 어둑해져서야 흙강아지가 다 되어 집에 들어왔다. 겨울날 아랫목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는 “아이고, 내 강아지!” 하며 깔고 앉은 이불을 걷고 얼어붙은 내 손을 파묻어 주었다. 손에 온기가 돌아오는 동안 밖에서 무얼 하고 놀았는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종일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던 그에겐 적적함이 일상이었을 것이다.
내가 열 살쯤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일요일 아침마다 성경책이 든 가방을 메고 교회를 따라다니는 새로운 임무 역시 내 몫이 됐다. 다리를 저는 노인의 걸음으로는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특히 중간에 큰길 하나를 건널 때는 양옆을 빈틈없이 살피면서 민첩하고 안전하게 할머니를 모셔야 했다. 길가에 늘어선 가게들을 구경하면서 할머니와 손을 잡고 오가는 길은 퍽 재미있었다. 예배 시간은 지루했지만, 짐짓 의젓한 척 앉아 이런저런 공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할머니를 극진하게 모시고 오는 어린 손자에게 효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나는 그걸 듣는 게 좋았다.
팔순이 다 되도록 글을 모르셨던 할머니는 성경책을 읽기 위해 한글과 숫자를 배우고 싶었다. 이것도 눈높이교육에 가장 가까운 내가 맡았다. 할머니는 열심히 공부했고 금세 혼자서도 척척 필요한 책장을 펴고 글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우리는 기뻐했다. 어딜 가나 “공부 잘하는 내 손자가 글을 가르쳐 줬다”라고 자랑했고 나는 더욱 뿌듯했다.
할머니는 좋은 친구였고, 그와의 수많은 추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로 남았다.
철학시간, 평행이론
미카엘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두어 달 지난 어느 봄날, 철학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이라며 말을 꺼냈다. 가만, 철학이라고? 철학 시간이 아직도 있다고? 그렇다. 대접받는 과목은 못 되지만 고등학교에도 교양과목이라 할 수 있는 철학이 있다는 걸 나도 안다. 왜냐면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 덕분이다.
오래전 나의 고1 철학 시간에 생긴 일이다. 신입생인 우리에게 철학이란 과목은 낯설었다. 그해 처음 생긴 수업이라고 했다. 1학년 1학기에만 일주일에 한 시간씩, 그러니까 그야말로 흉내나 내듯 핥고 지나간 셈이다. 담당 선생님도 시작부터 “이 과목은 입시에 안 나온다. 교내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안 본다.”라고 선언했다. 내용도 별것 없었다.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들이었는데, 어느 날은 과제가 주어졌다.
20분간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관하여 쓰고 나머지 시간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보라는 것. 공부벌레들은 난감하거나 심드렁한 표정이었지만 공부에 별 관심이 없던 내게는 구미가 확 당기는 이벤트였다. 고교 3년을 통틀어 가장 집중한 수업시간이 아니었을까도 싶다. 애들은 대충 짧게 몇 줄 쓰고 말았는데 내 것이 가장 길었다. 그래봐야 고작 한 페이지가 될까 말까 한 정도의 분량이었다. 나의 발표가 끝나자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칭찬을 해주었고 다 같이 박수를 치자고 했다. 축구 잘하는 반 대표 히어로가 학급 대항전에서 멋진 결승 골을 작렬시켰을 때 박수세례가 쏟아진다면, 지금 이런 기분일까? 어리벙벙했다.
이후 철학시간의 기억은 거의 없다. 학교에서 그마저 수업도 생략하고 자율학습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착한 철학 선생님은 교실 한구석에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다 종이 치면 나갔다.
할아버지와 미카엘
그로부터 30년 뒤 미카엘은 어쩌다 보니 내 고등학교 후배가 됐다. 그리고 그 학교의 그 시간에 또 비슷한 이벤트가 있었던 모양이다.
미카엘의 철학 선생님은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란 주제로 작문을 하고 발표를 하자고 했다. 미카엘은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우리 할아버지는 연로하신데도 변함없이 근면하며 학구적이십니다. 노인 일자리가 나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시나 봅니다. 늘 수영장과 도서관을 오가며 심신을 수양하고, 집에서도 독서를 하고 붓글씨를 쓰십니다. 본받을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발표 뒤에 미카엘은 선생님의 유도로 친구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순신 안중근 등 공식적인 위인이 아닌, 가족을 선정한 데서 보이지 않는 가산점을 받은 게 아닐까 추측해본다.
나는 한동안 기분이 좋았다. 30년이란 시간을 사이에 두고 같은 학교(어쩌면 같은 교실일지도 모른다!), 같은 수업시간에 부자에게 비슷한 일이 생긴 것도 그렇고 손자에게 존경받는 할아버지라니 이 또한 얼마나 멋진 일인가. 자식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 일화는 할아버지에게 곧바로 전달해야 마땅했다. 이야기를 전해 듣고 흐뭇해진 할아버지는 내색 안 하는 척하면서도 손자들에게 용돈을 쾌척하시며 기분을 냈다.
할머니 역시 몹시 기특해했다. 그러면서 부럽기도 했는지 “나중에 로사는 할머니를 제일 존경한다고 하자?”라며 옆구리를 찌르는데, 무적의 사춘기 로사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에잉”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성질이 못 돼먹은지라 할머니와 자주 다퉜던 나와 달리 미카엘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잘 지낸다. 맨날 똑같은 잔소리에도 반죽 좋게 대답 잘하고 짜증도 안 내는 걸 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재미있게도 할아버지의 학창시절 흑백사진을 보면 거기 미카엘 얼굴이 있다.
중학교 다닐 적에 아버지를 여읜 내 아버지는 손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우리 아버지는 손자란 걸 못 보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는 무슨 복으로 손자 손녀 다 봐가면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걸까?”
손자 손녀한테 좋은 추억을 유산으로 매일매일 남기고 계시는 것이니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시·에세이 > <아빠의 비밀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5.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4) | 2022.02.19 |
|---|---|
| 04. 보이후드 (2) | 2022.02.18 |
| 03. 순수의 기원 (4) | 2022.02.17 |
| 01. 미국아빠 판타지 (1) | 2022.02.15 |
| 00. <아빠의 비밀일기> 연재 예고 (1) | 2022.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