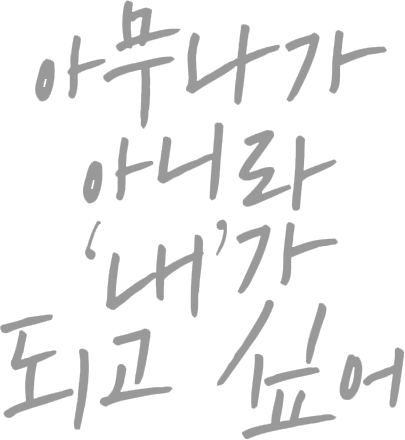
독일에 머물며 호텔 로비에서 피아노 연주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호텔을 A부터 Z까지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다.
호텔에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침 나의 생각을 아는 듯 친구가 곧 오픈할 리츠칼튼 호텔에 지원을 할지 고민 중이라는 얘기를 했다. 리츠칼튼은 당시 최고급 호텔이었다. 주저할 것 없이 친구를 설득해 리츠칼튼에 같이 지원을 했다.
호텔이 새로 들어서면 개관 6개월 전부터 직원 채용을 시작하기에, 두 달 전에 들어간 건 막차를 탄 셈이었다. 그때만 해도 이 하찮아 보이는 직무가 나를 미국으로 데려갈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열차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리츠칼튼은 아시아에 처음 생기는 리츠칼튼 서울에 대단한 정성을 기울였고, 세계 여러 지점의 총지배인과 부지배인 150명을 서울에 파견했다. 이들은 오픈 전 3주 동안 서울에서 650여 명의 직원을 교육했다. 로비에서 일하는 고객 서비스 팀을 교육하기 위해 온 담당 간부들과는 3주 동안 매일 얼굴을 마주쳤다.
교육 현장에서 프로페셔널한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서툴기 일쑤였다. 당시만 해도 서울은 영어가 잘 통하는 지역이 아니었고 영어로 된 간판이나 안내문도 흔하지 않았다. 우체국에 가거나 은행에 갈 때마다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감기에 걸려도 약을 사지 못해 끙끙대곤 했다. 그들이 난처해 하는 걸 본 나는 그 어려움을 공감했다. 독일에서 지내는 동안 외국인으로서 힘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내 직무는 아니었지만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고 싶었다. 어쨌거나 우리를 도와주려고 멀리서 온 이들이 아닌가.
“은행에 간다고요? 거기는 이렇게 가면 돼요. 지도를 그려 줄게요.”
“감기약을 사기 어려워요? 제가 대신 사 오면 되죠.”

나는 그들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왔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보디랭귀지로 그들과 소통했다. 때로는 설명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곳까지 함께 가기도 했다. 그런 나를 동료들은 좋게 보지 않았다.
“뭐 하러 그런 일까지 해?”
“잘 보여서 뭐 하게?”
잘 보이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능력도 학벌도 대단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손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거기에 이들은 우리를 교육해 주겠다고 온 사람들 아닌가!
얼마 가지 않아 나는 해외 간부들의 해결사가 되었다. 그들이 내 이름인 ‘하주현’을 발음하기 어려워해서 가톨릭 세례명인 ‘줄리아(Julia)’로 부르도록 했다. 그들은 사소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줄리아’를 찾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줄리아’를 추천했다. 해결사 줄리아로 산 지 3주 정도가 되었을까?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
“줄리아, 혹시 미국의 리츠칼튼에서 근무해 보고 싶지 않아요?”
'시·에세이 > <아무나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5. 한국이 어디야? 왜 영어를 못해? (5) | 2022.02.25 |
|---|---|
| 04.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다. (2) | 2022.02.24 |
| 02. 피아노 한번 쳐 보지 그래요? (3) | 2022.02.21 |
| 01. 희망 없이 털썩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1) | 2022.02.20 |
| 00. <아무나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어> 연재 예고 (3) | 2022.02.18 |




댓글